협력의 유전자 (동아)
|
제목 |
|
|
저자 |
니컬라 라이하니 |
|
분야 |
자연과학 |
|
출판 |
한빛비즈 (22.09) |
|
청구기호 |
<책 소개>
“모든 생명의 유전자에는 협력이 새겨져 있다!“
지금껏 품어왔고, 또 영원히 마주하게 될
인간 본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걸작
“협력은 세상을 만들었다, 사소한 것부터 그야말로 장엄한 것까지!“
협력과 배신을 통해 이룩한 모든 생명의 진화에 관하여
최근 우리는 개인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여러 위기를 직면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등장으로 전에 없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였고,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멸종 등 인간의 이기적 행동으로 야기된 여러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기적’ 존재인 것일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런던대학교(UCL) 생물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진화심리학자인 니컬라 라이하니는 그녀의 첫 번째 저서인 《협력의 유전자》에서 지금까지 이기적인 존재라 오해받아 온 인간의 본성이란 ‘협력’임을 지적하며, 협력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가능케 한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심리학과 진화생물학 등 분야와 종을 초월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해온 니컬라 라이하니는 우리 인간 역시 협력을 통해 존재할 수 있었다 말한다. 인간이란 약 수십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다세포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는 이유, 할머니의 존재, 편집증과 질투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서로를 속이는 까닭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현상과 군상 역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협력의 유전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이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지적한다. 협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협력의 진화 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진화의 역사를 톺아볼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생명체의 이야기도 함께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에 대해, 그리고 이 행성을 공유하는 다른 종에 대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으며, 그 길 위에서 협력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본성임을, 또 이 모든 진화와 번성을 이룩한 진짜 힘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_13쪽, 들어가며
유전자를 이기적이라고 묘사한다고 해서 이기적 인간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부도덕, 교활함, 고약함 같은 특성이 유전자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사악하기 그지없는 개체의 몸에만 존재하는 이기적 특성과 관련한 유전자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약 2만 6,000개 모두를 ‘이기적’ 유전자로, 조금 부드럽게 말하자면 ‘자기중심적’ 유전자로 묘사할 수 있다. 이는 유전자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있다는 뜻이다.
-36쪽, 01_진저리치게 만드는 눈
가장 강력한 공격성과 침습성을 보이는 암은 이렇게 다양한 세포가 서로 돕는 군집에서 비롯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암을 바라본다면 더 보편적인 요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협력인 것이 다른 쪽에서는 경쟁이다. 암세포 군집은 다세포 생명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지만 숙주는 이 협력 탓에 크나큰 희생을 치른다. 그래서 씁쓸하고도 허탈한 상황이 벌어진다. 전투에서 승리한 암일지라도 끝내는 전쟁에서 지고 만다. 암은 대부분 전염하지 않아 숙주의 몸을 벗어날 길이 없다. 목적을 이루고자 배를 잠깐 납치한들, 배가 가라앉으면 배와 함께 죽는 법이다.
-64쪽, 03_내부의 적
부모가 새끼를 보살피는 과정 곳곳에는 갈등이 도시란다. 설사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우더라도 상대보다 조금 덜 투자하고 싶은, 상대가 새끼를 세 번 챙길 때 자신은 두 번만 챙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실험에 따르면 금화조 암컷은 수컷이 믿음직할수록 게으름을 피워 육아에서 힘든 일을 수컷에게 더 많이 떠넘긴다. 암컷의 이런 전략이 위에서 말한 아주 얄궂은 결과로 이어져 어미만 있는 새끼보다 어미와 아비가 모두 있는 새끼가 더 부실하게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 (…) 이론가들은 부모 한쪽이 육아에 조금 소홀하면 다른 한쪽이 상대보다 더 적게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더 떠안아 모자란 부분을 메꿀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설령 그렇더라도 빈틈을 완전히 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89쪽, 05_개미와 베짱이...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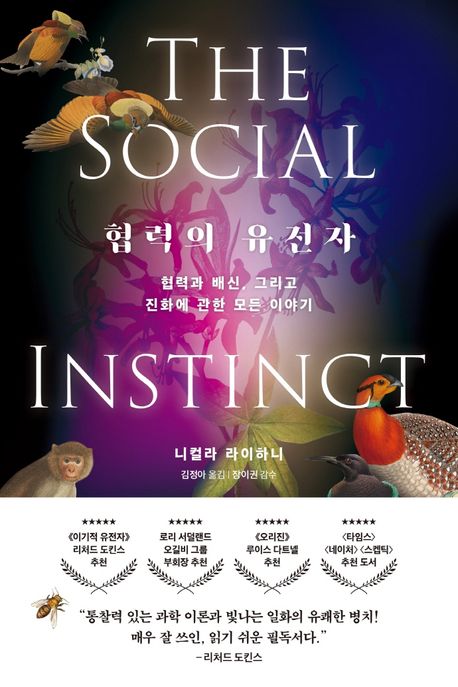







Add comment